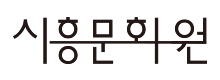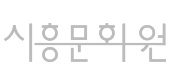생금집 전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15 15:56본문
● 생금집 전설
죽율동에 '한배미'라는 마을이 있다. 댐은 '대암(竹栗)'이라고도 부르며, 한자로는 '대답(大畓)' 혹은 '대촌(大村)'이라고도 하는데, 대답이라면 '한배미', 즉 '큰 배미'란 뜻이다. 그런데 이 댐 마을에는 벌써 12대째 살고 있는 금녕김씨(金寧金氏) 댁이 있으며, 이 댁을 또한 '생금집'(죽율동)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니까 한자로는 '生金집'이란 뜻일 것이다. 여기에 얽힌 이야기가 아래와 같이 전하고 있다.
그 날도 할아버지 김창권(金昌權)은 새벽부터 망설였다. 집 근처 산에는 이제 땔나무다운 거리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낙엽 부스러기 정도이고, 그것 가지고는 긴 겨울을 땔 나무로서는 적당치가 않았다. 좀 굵직굵직한 나무등걸이라야 불길도 세고 오래 타고 구들장을 따뜻하게 해주겠는데 그런 등걸이 집 근처 산에는 눈에 뜨이지가 않았다. 언젠가 썰물로 갯물을 빠질 때 저 바다 건너 덕물도(옥구도)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역적산(옥구도에 있는 돌주리산을 지칭)에는 나무가 무성한 뿐만 아니라 삭은 나뭇가지가 많았고, 아무도 나무를 하러 오는 사람이 없는 것 같기도 하였다. 그때도 은근히 그런 광경을 본 할아버지는 어지간하면 하루쯤 이곳으로 나무하러 오면 좋겠다고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막상 덕물도까지 나무하러 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거리도 멀 뿐만 아니라, 썰물 때를 잘 맞추지 않으면 당일로 되돌아오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는 날짜를 짚어보았다. '오늘이 며칠인가? 음력 스무날, 그러니까 꺼끔대로구나.' 할아버지는 일찍 아침상을 물리고 지게를 지고 집을 나섰다. 오늘은 썰물 시간이 좀 긴 듯하니 생각난 김에 덕물도로 갈 작정이었다. 썰물이 빠져나간 갯바닥에서 그래도 돌멩이들이 뒹구는 언덕길을 따라 10리는 족히 될 듯한 덕물도까지 쉽게 갔다. 밀물 때까지는 아직 한 식경(食頃)이나 더 남은 듯싶었다. 역적산 아래에 있는 유명한 생금우물가에 할아버지는 지게를 내려놓고 부지런히 삭은 나무등걸들을 모아들였다. 몇 아름 안아다가 지게 앞에 내려놓고 담배 한 대를 피워 물었다. 그때였다. 저 오른편 조금 굽이져 평평한 바닥에서 무엇인가 번쩍번쩍하는 것이 눈이 부시게 빛났다. 사금파리가 햇빛을 받아 그러는 것인가, 여기고 고개를 돌렸다. 얼마 후 다시 그곳을 바라보니 여전하였다. 이상하다 하고 일어서서 보니 움직이는 것이었다. 눈을 닦고 다시 보았다. 무엇인가 움직이고 있는 모양이었다. 가까이 가보려고 걸음을 옮기어 가만가만 다가갔다.
그런데 웬일인가? 그 번쩍이던 것은 한 마리의 닭 아닌가. 노란, 샛노란 털을 가진 한 마리의 닭이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몸을 움직이기는 하나 걷지를 않는 것이었다. 눈이 부시게 빛나는 닭 한 마리가 움직이지를 못하여 가까이 가서 두 손으로 안았는데도 가만히 있었다. 자세히 보니 보통 닭과 달랐다. 이거 별난 것이로구나, 라는 생각이 들자 할아버지는 점심 싸가지고 온 보자기를 풀어 그 닭을 잘 쌌다. 그러고는 나무도 대충대충 하는 둥 마는 둥 적당히 모아 지게에 짊어지고 돌아오는 길목으로 나왔는데 아직 밀물 때는 아니어서 마음이 놓였다. 나무를 얹은 지게를 지고 보자기에 싼 닭을 안고 급히 물이 빠진 갯바닥길을 건너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오자 곧 아무에게도 말을 않고 사랑방으로 들어가 골방에 있는 반닫이 속에 그 닭을 넣었다.
그런데 그때 보자기에서 꺼낸 후에 보니 보자기에 닭털 한 개가 빠졌는데 그것이 단단한 것이어서 이리저리 둘러보았으나 도무지 닭털 같지가 않았다. 노란 광채가 일고 있는데, 흡사 금속, 그것도 금을 펴서 만든 것 같았다. 할아버지는 그 닭털을 고이 간직하며 시치미를 딱 떼었다. 이튿날 할아버지는 밖에 좀 다녀오겠다고 집안식구들에게 이르고 그 닭털을 싸들고 한양으로 길을 떠났다. 한양에 올라온 할아버지는 그것을 금방에 가져가 물었다.
"이런 것이 하나 생겼는데 무엇인가 좀 보아 주시오."
가게 주인은 그것을 받아 보더니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서 이렇게 말했다.
"아니. 이건... 묘하게 만든 것이네요. 어떻게 금으로 이렇게 얇게 예쁘게 만들었을까? 이것 어디서 났습니까?"
할아버지는 그저 어안이 벙벙하였다.
"그건 알 것 없고... 어디 값이나 좀 쳐보시구료."
가게 주인은 저울에 달아 보더니 50냥은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할아버지는 그것을 팔아 50냥을 받아들고 그 가게를 도망치다시피 뛰어나왔다. 집에 돌아온 할아버지에게는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집안식구 아무에게도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돈이 생긴 내력을 이야기 안 할 수도 없고 하여 며칠을 뜬눈으로 새우다시피 하였다. 하룻저녁은 할머니가 할아버지와 단둘이 마주앉아 입을 열었다.
"요새, 무슨 걱정이라도 생겼소?"
할아버지는 가슴이 덜컥하였다. 그러나 시침을 떼고 대답하였다.
"걱정은 무슨 걱정...."
"아니에요,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겼나 봐요, 그렇지 않고서야 잠도 제대로 안 주무시고... 벌써 며칠째예요."
내외지간이란 숨길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없다고 굳게 믿고 그렇게 살아온 할아버지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다. 이미 무슨 낌새를 알아차린 듯한 할머니의 말을 그저 부인할 수만도 없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결국 모든 것을 다 털어놓았다. 그러고는 함께 골방으로 들어가 그 닭을 꺼내보았다. 여전히 닭은 있었고 숨은 쉬지 않으면서 꼭 살아 있는 닭이었다. 그뿐이 아니라 반닫이 바닥에는 며칠 전에 보던 닭털이 노란 광채를 발하면서 몇 개 떨어져 있었다. 할아버지는 이제 가난을 좀 떨어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렇다고 화수분처럼 쏟아지는 황금 닭털을 그냥 계획 없이 쓰고 싶지는 않았다. 살림을 더욱 아끼고 씀씀이를 절약하면서 며칠에 한 차례씩 그 닭털을 들고 새로운 금방을 찾아다니면서 돈으로 바꾸었다.
그렇게 하기를 1년. 웬만큼 모아진 돈으로 땅도 새로이 마련하고 집도 새로 넓히고 하였지만 반닫이 속의 황금닭은 여전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누구 입에서부터 나왔는지 이런 소문이 떠돌기 시작하였다. "저 김씨 댁에는 황금닭을 얻었대", "아니 생금닭이래", "아니 황금알이래"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이들이 멋대로 떠드는 소문이었지만, 할아버지는 일절 그 말을 부인하고 있었다. 다만 말이란,
"자네들도 열심히 일하고 돈을 아껴 쓰면 머지않아 나처럼 논도 사고, 밭도 사고, 또 집도 크게 짓게들 돼. 그뿐인가, 생금닭도 얻게 되지."
하는 것이었다. 그 후로 할아버지 댁은 아예 '생금닭'이란 댁호(宅湖)까지 붙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도 그러려니 하면서 자기들도 열심히 일하면 '생금집'처럼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면서 모두가 열심히들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었다.
세월은 흘러 몇 해인가 지나고 저 멀리 영남 쪽으로 출가한 딸이 오랜만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 황금닭을 얻어가지고 친정이 불 일듯이 번성하게 된 후에 처음으로 친정에 다니러 왔다. 딸은 우선 동네에 들어서자 놀랐다. 시집가기 전에 자라던 옛집은 모양부터 달라지고 번듯한 사랑채며 안채의 규모가 예삿집 같지가 않았다. 눈을 비비며 자세히 보았으나 틀림없는 자기 집터였고, 대문을 들어서자 맞이하여 주는 친정어머니며 이윽고 안채로 들어서는 친정아버지며... 어찌된 영문인지를 몰랐다. 그날 저녁, 딸은 친정어머니로부터 이야기를 겨우 들었고, '생금집'이란 댁호까지 붙어져 있음을 알게 되었다. 딸은 그런저런 이야기를 듣는 동안, 별로 가난하지는 않지만 지금의 친정에 비하면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자기 시집의 살림은 형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의 욕심이란 그런 것이었다. 할아버지가 하루는 한양에 다니러 간다고 집을 나섰고, 친정어머니도 이웃동네 잔칫집에 나들이 갔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모두 집을 비우시고 사랑채는 텅 비어 있었다. 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골방으로 들어갔다. 반닫이는 굳게 잠겨 있었다. 그런데 일이 되느라고 그 반닫이 바로 위에 열쇠가 있지 않은가. 아마 아버지가 잠그고서 열쇠를 그냥 두신 모양이었다. 반닫이를 열고 속을 들여다보니 눈이 부시었다. 컴컴한 골방에, 그것도 거기 놓은 반닫이 밑바닥에서 광채가 나는 물건이 눈이 부시었다. 멈칫하다가 꺼내보니 분명히 황금으로 된 닭이었다. 덜덜 떨려서 곧바로 제자리에 놓았다. 그리고 몇 개 빠져 떨어진 닭털을 집어들었는데 역시 금이었다. 그러나 눈길은 집었다 도로 제자리에 놓은 닭에게로 갔다. 다시 닭을 집어들었다가 또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그러나 딸의 눈시울엔 시집식구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이윽고 딸은 그 황금닭을 치마폭에 싸 안고서 골방을 나왔다. 그러고는 집안식구에게는 아무 말도 않고 그냥 시집으로 갈 생각에 줄달음치고 말았다.
해가 질 무렵 어느 주막에 들러 하루를 쉬고 이튿날 다시 길을 떠났다. 얼마쯤 가다가 치마폭에 싼 황금닭을 확인하려고 펼쳐보니 이게 웬일인가. 분명히 황금빛으로 눈이 부실 텐데 이건 보통 돌덩이가 아닌가. 이리저리 뒤져보아도 분명 돌덩이였다. 순간 딸은 깨달았다. '황금닭은 따로 주인이 있다. 내가 지닐 것이 못 된다.' 무엇인가 깨달은 딸은 그 길로 친정으로 발길을 돌렸다. 친정에서는 난리가 났다. 황금닭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오랜만에 친정에 온 딸이 없어졌기 때문이었다. 할아버지는 급기야 황금닭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지만 입밖에 낼 수도 없고 할머니와 둘이서 끙끙 앓고만 있었다. 이튿날 저녁에서야 딸은 다시 돌아왔다. 그러고는 곧 사랑방으로 나가 친정아버지에게 엎드려 사죄하며 일시 눈이 멀어 저지른 죄였다는 것과 그것은 한낱 돌멩이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고백하였다. 친정아버지는 자초지종 딸의 이야기를 듣고는 조용히 말하였다.
"알았다. 네가 그것을 보고 가지고 싶은 생각이 든 것은 인지상정이니라. 그러나 착하다. 한때 잘못을 뉘우친다는 것은 그만큼 값진 것이다."
"생각하면 나에게는 이제 그 이상 그 덕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 어쨌든 이 정도로 우리 살림이 풍족해졌으면 나도 이제 욕심을 거두어야지..."
다시 할아버지는 온 집안식구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고는,
"그 동안 우리집을 '생금집'이라고 부르게 된 동기는 바로 이 돌멩이 덕이다. 나는 이것을 덕물도에 나무하러 갔다가 우연히 주워왔다. 그리고 그 덕을 톡톡히 보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는 처세나 살림을 호사스럽고 호탕하게 한 적은 없었다. 아마 이제 이 정도로서 우리 집안은 더 이상 이 돌의 덕은 보지 않아도 열심히 일하면서 잘 살게 된 것으로 알자."
고 하였다. 한편 친정아버지는 다시 시집으로 돌아가는 딸에게 서운함을 가시어 주려고 얼마간의 재산을 쪼개어 주면서,
"이것을 바탕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여 가문을 융성케 하여라."
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그 돌은 고이 싸서 신주처럼 모시었지만 다시는 광채가 나는 황금빛 닭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계기가 오히려 이 할아버지네 가족 구성원들에게뿐만 아니라 시집간 딸의 식구들에게도 일한다는 즐거움, 욕심내지 않고 분수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는 의식을 심어주게 되었고, 그 정신은 오늘날에도 이 '생금집'에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생금집은 1994년 향토유적 제7호로 지정되었다.
최고관리자 admin@domain.com